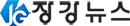4
동네사람들은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 위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있었다. 술상을 앞에 놓고 술잔을 돌렸다. 삶은 돼지고기와 김치와 즐겁게 나누는 푼푼한 정담으로 안주삼아 막걸리를 마셨다. 누군가는 소주를 찾았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떠들며 즐겼다. 거나하게 취하니 목소리도 커졌다. 청년들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유행가를 불렀다. 누군가 뱉어대는 한 마디의 농담으로 웃음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했다. 탐스럽게 살이 오른 햇빛이 차일처럼 덮어 따뜻했다. 멧비둘기는 마룻대에 앉아 집터를 둘러보더니 뒷동산으로 날아갔다. 정오가 지나니 산그늘이 내려와 마을을 시나브로 덮고 있었다.
“푸닥진 음식이니 손가락으로 안주삼아 술이나 많이 드시오.”
운현은 집터의 기둥사이를 돌아다니며 살펴보다가 마당으로 나왔다. 동네사람들에게 인사치례를 했다.
“이만하면 큰잔치요. 같이 한 잔 합시다.”
단산양반은 막걸리 잔을 상 위에 놓으며 입술을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나는 원래 술을 못하니까.”
운현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지 말고 이리 앉아요.”
“술이 독약인지 입에 대지 않으니까 권하지 마.”
인동양반이 말렸다. 동네사람들은 나주양반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술좌석에는 빗감도 하지 않았다. 장날에도 술집은 멀리 피해 달아나버렸다. 알코올이 한 방울이라도 입속으로 들어가면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타고나기를 잘못 되어서….”
운현은 빙긋이 웃으며 얼렁뚱땅 넘겼다. 원래 체질적으로 맞지 않기에 냄새도 싫어했다. 언젠가 사이다를 마셨는데 취하여 정신을 놓았었다. 술이란 사람을 병신으로 만든다는 철학도 함께 담겨있어 항상 멀리 피했다.
“그래도 주인이….”
월평양반이 돌아보았다.
“상량식에 와주셔서 고맙고 미안합니다.”
운현은 동문서답하며 고개를 돌렸다. 입술을 빨며 사립문을 응시하며 총총 걸어갔다. 타관에 있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자식 놈들이 공무원들이라 올 수 없겠지.’
운현은 혀를 차며 사립문을 나섰다. 동네 앞 고샅에 서서 신작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공무로 바쁘더라도….’
운현의 눈앞에는 자식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왠지 섭섭했다. 기별을 했으니 오늘만은 모든 일을 팽개치고 들여다보았어야 되었다. 새 둥지를 지으니 가족들과 함께 좋아하며 행복을 만끽하고 싶었다.
“왜 여기 나와 있어요?”
나주댁은 동네 앞 둘째아들집에서 그릇을 가지고 오면서 남편을 보았다.
“그냥….”
운현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남산의 마루터기를 바라보았다.
“오지 않을 자식들 기다리고 있죠?”
“일곱 남매 모두가 참석했으면….”
운현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빨리 와요. 저녁을 먹게.”
나주댁은 고샅으로 들어가며 당부했다.
‘벌써 해가 져가네.’
운현은 저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해거름이 되면 가끔 먹을거리가 없어 배가 고팠을 때가 생각났다. 감칠맛 나고 풍성한 음식을 생각하며 군침을 삼켰다. 석양이 저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태양은 수리봉 위에 얹혀있었다.
‘식구들이 보금자리로 찾아드는 황혼녘이구나.’
운현은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어가는 구름을 응시했다. 산새 몇 마리가 날아와 집 앞 대밭으로 들어갔다. 멧비둘기도 날아와 자리를 잡느라 푸덕거렸다. 바람은 꽃향기를 싣고 와 코끝에 묻혀놓고 가버렸다.
“소쩍, 소쩍, 소쩍,….”
두견새는 남산의 능선에 있는 소나무에 앉아 서러움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쫏쫏쫏….”
뒷동산에서는 머슴 새가 소를 몰고 보금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땅거미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덮이면서 산골의 밤은 시작되었다.
5
어둠이 빽빽하게 가득담긴 마당에서는 화톳불이 활활 타올랐다. 소삽한 밤이라 불가에는 몇 사람이 둘러 앉아 따뜻함을 즐겼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속삭이듯이 반짝거렸다. 축하라도 하듯이 남산 위에서는 유성이 별똥을 흩뿌리며 사라졌다. 두견새가 노래하고 머슴 새가 소를 몰며 둥지를 찾아가고 있었다.
“깨갱깽, 징-, 투덕 투덕, 타닥탁,….”
동네사람들은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신명나게 춤추며 농악놀이를 했다. 꽹과리, 징, 북, 장구, 소구를 두들기며 흥겹게 놀았다.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마당을 정신없이 펄쩍펄쩍 뛰며 돌아다니는 농악꾼들은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슥하게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맴돌았다. 겨우 내에 웅크렸던 몸을 꿈틀거렸다. 배 아픈 시샘은 감추고 동네의 경사라고 하며 즐거워했다.
“닭죽이요.”
석표는 닭죽이 든 동이를 들고 나오며 소리쳤다.
“닭죽까지 쑤어주네.”
꽹과리를 치던 상쇠가 농악을 멈추었다. 모두가 두레상으로 모여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한 그릇씩 받아들고 불 가로 갔다.
“밤은 깊어 시장기가 들 시간이라….”
진표는 다른 상을 들고 왔다. 멍석 위에 펴 놓았다.
“꼽꼽쟁이 나주양반이 오늘은 어쩐 일이야?”
“좋은 집을 지으려고 상량을 했으니 이보다 좋은 날이 있어.”
“경사 중에 경사지.”
“이럴 때에 쓸려고 움켜쥐었겠지.”
동네사람들은 한 마디씩 하며 닭죽을 후르르 마셨다. 막걸리도 한잔씩 돌아갔다. 닭죽을 먹고 나서 남몰래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밤도 깊었고 닭죽도 먹었으니 집으로 갑시다.”
동네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피곤했다. 내일 일도 생각해야 되었다. 농사철은 아니지만 농사준비로 쉴 틈이 없었다.
“잘 놀다 갑니다.”
동네사람들은 마당을 나서며 인사했다.
“사량식에 참석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진표는 동네사람들을 배웅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당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뭉근하게 타던 화톳불은 시나브로 시들어 흔적조차 없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밤의 차가운 손길이 볼을 어루만졌다. 그믐날이라 달빛이 없어서 유난히도 캄캄했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