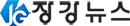3
“무슨 똘기감이야?”
운현은 방으로 들어서며 구석에 있는 풋감을 보고 아내에게 물었다.
“감나무 밑에 떨어져 있기에 주어 왔어요.”
금순은 어눌하게 말했다.
“땡감을 먹으려고?”
운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꽃이 떨어지고 맺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
“떫어서 어떻게 먹어?”
“그냥….”
“임신하면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다니 고작 떫은 풋감이 먹고 싶어서?”
“…….”
“무어가 가장 먹고 싶어? 똘기과일 말고.”
운현은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서러움이 복받쳤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참았다. 마음 같아서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데 행동으로 옮길 수 없어 안타까웠다.
“…….”
금순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말해 봐요. 입덧하면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
“있으면 구해다 주려고?”
“가능한 것이면….”
운현은 아내가 안쓰러웠다. 동갑내기이기에 더욱 애정이 가졌다. 부모님 몰래 구해 와서 먹이고 싶었다.
“쌀밥에 고기가….”
금순은 남편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무슨 고기? 생선?”
“아니요. 돼지고기가….”
금순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요. 쌀밥과 돼지고기국물로 집안 잔치를 벌려보시다.”
운현은 울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쌀밥에 돼지고기는 가족 누구나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었다. 부모님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었다.
할머니와 부모님 생일날이나, 제삿날이나, 명절날이 되면 가능했다. 그 핑계로 끼니때에 쌀밥과 고깃국을 맛있게 만들어 식구들과 함께 푸짐하게 먹으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마음 놓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4
농부에게 농사는 삶의 모든 것이었다. 생명이 거기에 매달려있었다. 겨울에는 논갈이를 하였다. 봄에는 시기를 맞추어 못자리를 해야 되었다. 하지 전 삼일 후 삼일을 중심으로 무논에 모내기를 하였다. 호미로 아우거리를 하여 초벌매기를 했다.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벌 매기는 손으로 논바닥을 휘저으며 잡초를 재거했다. 보통 네다섯 번의 논매기를 하여주어야 벼를 제대로 기를 수 있었다.
부지런한 농부는 일곱 번까지 김매기를 하였다. 새벽부터 시작한 한 해의 마지막 김매기는 해동갑하여 끝났다. 무성하게 자란 나락 사이를 휘젓고 다니며 잡초를 제거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에는 지쳐 넘어지려고 했다.
“앞으로 도열병만 안하면 우죽으로 보아 논농사는 잘 지었어.”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날씨가 잘해주어야 되고 병충해도 없어야 하고 도열병이 오면 벼가 여물지 못해. 쭉정이가 되니….”
도열병은 잎이나 이삭 바로 밑의 줄기에 도열병균인 붉은 반점이 붙어 생겼다. 벼의 잎과 이삭이 말라죽었다. 벼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었다.
“멍석멸구가 생기면 먹을 것이 없어.”
“벼이삭이 고개 숙일 때에 멸구가 생기면 큰일이야.”
“병에는 약도 없고….”
도열병에 대한 약이 없었다. 도열병이 오면 썩어가는 벼를 바라보만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병든 벼의 잎을 뜯어 버리는 정도였다.
“벼를 튼튼하게 길러야 병이 생기지 않는데….”
“벼의 우죽이 잘 되면 보기는 좋은데 병충해가 심해.”
“그래도 벼가 잘 자라야 튼실하게 여무는데….”
“적당하게 잘 맞추는 것 그것이 어려워!”
운현의 친구들은 논매기를 끝내고 나오면서 한 마디씩 했다.
“운현아, 논매기를 하면서 보니까 너의 논에 멸구가 한두 마리 있는 것 같아.”
덕기는 논에서 나와 논둑에 서서 저녁노을 바라보았다.
“내 눈에도 보이던데.”
“멸구를 잡아야 되겠네.”
운현은 논매기를 할 때에 멸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멸구는 벼가 꽃필 무렵부터 많이 발생했다. 벼의 줄기에 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기생했다. 멸구가 있는 곳의 벼들이 군데군데 말라죽었다. 그래서 멍석멸구라고 말했다. 농사를 공들여 다지어놓은 수확기의 직전에 생기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쭉정이의 나락도 건질 수 없었다.
“보께로 물을 품어 잡으려면 기름이 있어야지?”
“상어기름을 내어놓은 것이 조금 있는데….”
운현은 봄에 장에서 상어를 사와 기름을 내어놓은 것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논에 기름을 군데군데 떨어뜨렸다. 밥그릇의 뚜껑 같은 기구로 벼에 물을 뿌려 멸구가 떨어지게 하였다. 물에 떨어지면 기름이 멸구를 감싸 숨구멍을 막아 죽게 만들었다.
“우리 집에도 기름이 조금 있을 거야.”
덕기는 논에서 나오면서 운현을 돌아보았다.
“날 주려고?”
“가져다 써.”
“고맙다. 다음에 갚을게.”
“오늘도 하루가 끝났네.”
논 김매기를 하는 품앗이의 하루가 끝났다. 하루의 논매기로 지치서 발걸음이 유난히도 무거웠다. 황혼녘 저녁노을 바라보며 논둑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몸이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했다.
“유두날이 언제지?”
운현은 국사봉 위로 얼굴을 내미는 찌그러진 초순 달을 보며 물었다. 친구들과 함께 논매기를 끝내고 회두리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숙형, 덕기, 기운과 함께 품앗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오늘은 자신의 논에서 김매기를 했지만 내일은 다른 친구의 논으로 가야 되었다. 이렇게 함께 농사를 지의면 재미있고 힘든 줄 몰랐다.
“며칠 남지 않았어.”
“올 벼농사도 다 지어가네.”
“우죽은 잘 되었는데. 병충해가 없고 날씨만 잘 해주면 금년에도 풍년이 들겠지.”
“풍년이 들어봐야 뭇갈림 농사라 소작료 내고 공출로 빼앗기고 나면 남은 게 있어야 먹고 살지.”
“배메기 농사라도 많이 지으면 떨어진 콩고물이라도 생기지 않아?”
“고자품을 팔고 싶어도 있어야….”
“나라를 빼앗겼으니….”
“유두 전날 기운이네 돼지를 잡은 다고 하던데?”
숙형은 분위기가 침울해지는 것이 싫어 어깃장을 놓았다. 큰소리로 앞에 가는 기운에게 물었다. 농사철의 유두날은 큰 명절이었다. 김매기가 끝나가고 나락이 배동하기 시작하였다. 벼가 꽃을 피게 되면 논에 들어가지 않았다. 물고를 조정하여 물의 높이를 적당하게 맞추어 놓으면 되었다.
“그럴 거야. 잡을 테니 와서 한 다리씩 팔아주라.”
기운은 우울해진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당당하게 대거리했다. 돼지고기장사를 하며 기분을 달랬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기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다리는 많고 다섯 근만 사자.”
운현은 쌀밥에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는 아내의 말이 떠올라 미리 부탁했다.
“운현이 너는 식구도 많은데 한 다리를 가져가지 그러냐?”
덕기는 운현을 동정했다.
“그럴 형편이 되면 누가 마다하겠니.”
운현은 괜히 서러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아내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알았다. 쟁기고기로 팔 테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살코기가 많이 붙은 좋은 부위로 준비 해 놓을 게.”
기운은 약속했다.
“나는 세 근만 주라.”
숙형은 군침을 삼키며 부탁했다.
“나도 다섯 근 주라.”
덕기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유두날을 기회로 가족의 목구멍에 떼를 벗기고 싶었다. 이럴 때가 아니면 고기 맛을 보기가 어려웠다. 한 해에 몇 차례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였다. 한가위나 설 같은 큰 명절 때에만 겨우 맛볼 수 있었다.
“알았다. 우리 집 돼지는 이백 근 안팎이어서 맛이 있을 거야.”
기운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빨며 신명나게 자랑했다.
“내일은 덕기 논으로 나와라.”
숙형은 골목으로 들어서며 당부했다.
“야, 덕기야.”
운현은 친구들과 헤어지며 덕기를 붙잡았다.
“왜?”
“어려운 부탁하나 하자.”
운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데?”
“혹시 너의 집에 쌀 있니?”
“모르지만 조금은 있겠지.”
“한 되만 빌려주면 안 될까? 가을에 갚을게.”
“어디다 쓰려고?”
“유두날 제사 지내고, 늙으신 할머니에게….”
운현은 아내가 먹고 싶다는 말을 못했다. 영절스럽게 핑계를 댔다.
“알았어. 내일 보자.”
덕기는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고맙다.”
운현은 사립문을 들어가며 인기척을 했다. 방안에서는 동생들이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가 유난히도 소란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