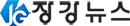한 번 맺어진 인연…부모의 정, 부부의 정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TV나 신문 등을 통해 들려온다. 그 만큼 사람들 사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오던 연대의식과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서인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친구나 지인(知人)간의 배신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듣게 된다. 아들 딸을 둔 부부간에도 성격차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이혼이나 가정파탄 소식들도 자주 듣게 된다. 심지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홀로 살다 죽었다거나 자살했다는 얘기 등. 부모와 자식간 도리. 여기 한 번 맺어진 인연의 끈을 팽개치지 않고 정성을 다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 사이가 각박해져가는 요즘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1991년 8월 14일. 두 사람에게 크나큰 아픔을 안겨준 날이다. 1m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ROTC로 군복무를 마치고 광주에서 삼양식품이라는 직장생활을 하던 윤수현(당시 31, 황영남씨의 아들)씨가 경남 거창에서 내려오는 아내 신금연씨를 만나러 담양으로 마중나갔다 사고가 난 날이다. 비가 내리던 저녁 7시경 길 건너편에서 고모부의 차를 타고 오던 아내를 발견했다. 신혼에도 서로 떨어져 살던 윤씨부부였다. 윤씨가 아내에 대한 반가움이 너무 컸던 것일까.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반가워하던 윤씨가 무심결에 뛰어서 길을 건너가다 그만 그 곳을 지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 결혼 5개월만에 난 교통사고였다. 피는 안나고 손등만 긁히는 정도였던 이 사고로 한쪽 손과 발이 마비된 윤씨. 그로부터 윤씨의 어머니 황영남씨와 아내인 신금연씨의 가슴저린 세월은 시작된다.
아들 좀 살려달라는 어머니 황씨의 애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동진크린 등 3년 3개월의 병원생활에도 차도를 보이지 않은 윤씨를 1년동안 광주에서 돌보다 고향인 성전으로 내려왔다.
세 명의 오빠와 여동생을 둔 신씨. 당시 거창여상 수학교사여서 전도유망한 형편 오빠들은 젊은 나이이니 재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 동생도 형수님 좋은 곳으로 재혼하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신씨의 임신소식에 논의는 중단됐다. 신씨도 “한 사람 그르쳤으면 됐지 뭣하러 또 가느냐”고 반대했다. 병원입원 당시 부부관계를 하면 운동신경이 깨어날 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얘기에 딸과 아들을 낳게 된 것. 신씨는 교직에 있으면서도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해나갔다.
병원생활과 집에서 장애인이 된 아들을 돌보는 일은 어머니 황씨가 맡았다. 농사일도 팽개칠 수 밖에 없었고 옆에서 아들을 지켰다. 재활운동만 잘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몸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왼쪽 손과 오른 발은 조금 움직이지만 수저를 못잡아 떠먹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매 끼니마다 식사를 챙겨주고 대소변받아내는 것은 물론 세수와 면도까지. 몸에 땀이 차면 끄끕하고 종기가 생길새라 목욕도 잊지 않았다. 365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한 어머니의 정성이었다. 덩치 큰 아들을 씻고 운동시키기 위해 앉히고 눕히고 일으켜세우는 일은 해가 갈수록 힘이 줄어드는 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묵묵히 해나갔다. 생떼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상황에 맞닥뜨린 아버지는 홧병이 생겼다. 방안 벽지가 노래질 정도로 담배만 피워대다 사고난 지 8년만인 1999년 고인이 되셨다. 혼자남은 처지에도 10년 넘도록 아들을 철저하게 챙겨나갔던 황씨였다. 이렇게 아들 병수발을 꿋꿋히 해내던 어머니 황씨에게 황씨의 몸에서 건강검진과정에서 2010년 암이 발견되고 몸상태가 나빠지자 그동안 집에서 아들을 수발들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그 해 아들 윤씨를 목포소재 모 병원에 입원시키게 됐다. 병원입원한 지 3년만에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사고로 그만 2012년 사망하고 말았다. 그토록 가슴아파하며 정성을 다했던 아들이었지만 저세상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덩치 큰 아들을 수발드는 황씨를 보고 ‘장사’라는 소리를 했다. 지금도 아들 얘기를 하는 동안 복받치는 감회에 어깨를 들썩이며 금새 우실 것 같은 어머니 황씨. 뙤약볕에 밭 매지 말라던 아들. 직장생활 후 월급봉투를 자신의 손에 쥐어주던 아들. 이렇듯 사고나기전까지 황씨가 기억하는 아들은 인정많았던 아들로 기억된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장애인이 된 아들을 수발했던 황씨는 “내 아들 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 일 당해부니 오죽 학것이요”라며 당시의 억장이 무너졌던 심정을 전하며 “자식인데 으짜껏이요”란다.
아무리 어려워도 며느리와 살아야겠다는 황씨.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때문인지 거창에 사는 손주들 할머니를 핥고 빨고 할 정도로 애정을 표시한다고 한다. 지난 해 96세되신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모인 장례식장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손주들은 옆집에 할머니 밥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보일러고장 나면 고쳐주세요 등 주변 사람들은 황씨의 손주들 보면 타고 난 것 같다는 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