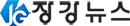시를 써야 했는데
김선태에 대한 시를 쓴다고 마음먹었는데
수술 날짜가 잡혀서
모든 원고를 마감하고 병원에 오려 했는데
며칠 밤 새고도 김선태는 건들지 못하고
당겨도 당겨도 오지 않는 김선태를 먼 섬처럼 두고
입원을 했네
이틀 금식에 전신 마취 김선태는 더 멀어지고
까마득해지고
아득해지고
수술이 끝나니 잠만 오고 김선태는 어디 갔나
저승에선 듯 이따금 김선태를 생각하고
변비처럼 걸리적거리는 김선태는 무얼하고 있나
그를 생각하면
치매가 오자 열흘 곡기를 끊고 소주 한 잔
사약처럼 청해 마셨다는 그의 어머니가 떠오르고
깡마른 어머니에게 죽음의 독주를 곱게 따루었을
소주보다 맑았을 그 자식들의 눈물방울이 또르릉 흘러가는 것만 같은데
동백꽃 뚝뚝 지듯 붉은 눈물이나 서로에게 흘렸을
동백 가족이 떠오르는데
그런 날엔 달빛은 얼마나 희었을까
시를 써야 한다고 열 댓 편을 휘갈겨 보았지만
김선태는 보이지 않고
김선태는 어디 멀리 가서 섬이 되었나
또 그 커다란 귀를 흘리며
귀가 맛있다
귀가 맛있다
파도 소리나 홀치고 있나
내가 아는 김선태는
내가 쓴 김선태는
김선태가 아닌 것 같고
진달래꽃 필 때면 강으로 오른다는 황복이
바위 위의 진달래꽃을 따먹어야 새끼를 칠 수 있다는데
그 중 어떤 황복은
맨 위 바위에 핀 진달래꽃
진달래꽃에 앉은 나비 날개를 훔쳐서 가장 강한 독을 지니게 된다는데
말하자면 김선태의 전생은
달밤에 나비 날개를 삼킨 그 황복이었을지도 몰라
그런 풋밤에 진달래는 붉고 나비는 희었을 것
일찍이 극치에 닿아서 불구가 되어버린 독기의 사랑이 떠오르고
삼킨 날개를 어쩌지 못해 마음은 얼마나 멀리 날아가 버렸을까
김선태를 생각하면
늘 절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한 사내의 쓸쓸함이 떠오르고
시를 써야 하는데
김선태를 시로 써야 하는데
아픈 몸으로 병든 시만 끄적이네
일주일째 흰죽만 먹는 내게 아내는
아무리 죽이어도 서른일곱 번은 씹어서 삼키라 하고
서른일곱 번쯤 죽을 씹어 삼키는 것은 죽을 맛은 아니지만
아무리 서른일곱 번을 생각해도
김선태는 씹어지지 않네
김선태는 아무래도
임무를 끝내고 적과 동침한 밀정 같다는 생각이 들고
칠량 앞바다 너른 뻘밭이 실은
김선태라는 고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일찍이 세상 끝을 보아버려 더는 바다로 나갈 생각을 않고
제 안의 오지만 더트고 있는 저 뻘밭이
고래 아닌가
고래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강진만 노을이 시뻘겋게 지는 것도 실은
해종일 자기만 들여다보며 눈을 끔벅거렸을 고래의 붉은 눈시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김선태를 생각하면 익은 밤송이 같은
구레나룻이 떠오르고
세수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일주일째 병원에 보관된 내 얼굴에도
풋밤송이 같은 터럭이 달렸으니
내가 이제 김선태에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종일 꽂힌 링거 줄에는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영양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데
왜 시는 안 주는 것이여?
머리를 쥐어뜯다가 불면으로 한 사흘 밤을 새고
시를 써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말똥해서
생각이 너무 밝아 시는 보이지 않고
시를 써야 하는데
김선태에 대한 시를 써야 하는데
눈은 다래끼 걸린 듯 씀벅거리고
제주 사투리로 윗눈 다래끼를 개좆이라 하고
아랫눈 다래끼를 개씹이라 하는데
개눈과 개씹이 붙었을 때의 껄끄러움과 피할 수 없음처럼
그와 나의 관계는 서로 아픈 숙명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열 두 시 넘어 전화해서
너는 알지야?
밑도 끝도 없는 말 던져 놓고
한 시간쯤은 엉킨 그물 같은 쓸쓸함을 던져주는 사내
막상 술 마실 때면
조껍데기 술에
씨껍데기 술이나 섞어 마시며
그런 조껍데기 씨껍데기 같은 소리나
지껄이다가 밤을 새고
또 경운기처럼 털털거리다가
그래도 시는 말이야 진정성이 있어야 해
한 마디 하고
슬픔이든 상처든 술이든 사랑이든
더 독한 것으로 치유하려 드는 저 극단주의자의 미학을 무어라 할까
그러다 진짜를 만나면
가령 대덕 조영현 형님 집에서 백화주를 마실 때면
한 모금 딱 하고 나서
백 가지 향기가 혀에 고랑을 내는 것 같다며
여기서 멈추고 오래 즐겨야겠다고
딱 한 모금만 하고 목포까지 갔다고 했지
그러다 명주리 오십 리 길 이야기 할 때면
진달래꽃 동백꽃이 얼굴에 먼저 번져서
마구 마구 꽃이 저질러지는 쓸쓸함이 무너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사내
바위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차가워도
바위 밑 석수 같은 눈물샘을 기르는 저 사내는 어찌해야 하나
한 백년 삭힌 물이 이슬보다 맑아서
뚝뚝뚝 시를 흘리는 저 오래된 칠량 옹기를 무어라 해야 하나
눈물로 뭉친 저 고래를 무어라 불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