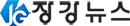우애는 형제 사이의 정과 사랑을 뜻한다. 친구 사이나 가까운 사이의 정분을 가리키기도 한다. 형제지간의 우애를 뜻하는 사자성어도 많다. 수족지애(手足之愛) 동기지친(同氣之親) 여족여수(如足如手) 등도 모두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를 뜻한다. 형만한 아우 없다거나 형제는 형제다라는 속담도 있다. 사자소학에는 형제지정에 우애이기라는 말이 나온다. 또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비롭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다는 뜻의 부의모자형우제공이란 말도 있다.
형제가 금덩이를 던지다란 뜻의 형제투금도 설화가 곁들여지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고려 공민왕 때다. 형제가 길을 걷다 황금 두 덩어리를 얻어 하나씩 나눠가졌다.
지금의 경기도 김포에 있는 양천강에 이르러 함께 배를 탔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자신의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형이 물으니 제가 평소 형을 사랑했는데 금덩어리를 나누고 보니 형이 미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 강물에 던져 버렸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형도 네 말이 옳다며 역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 그 뒤 양천강을 투금탄이라고 부른다.
또 가장 흔한 얘기로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다. 장자에도 형제간은 손발과 같아 떼어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의 형제위수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시경에는 형제혁장외어기모(형제는 담장안에서는 싸우기도 하나 밖에서 모욕을 당하면 함께 이를 막는다)란 말이 나온다.
정약용, 약전 형제의 우애도 널리 알려졌다. 조선시대 실학자이면서 목민심서를 지은 정약용과 자산어보의 저자 정약전형제가 각각의 유배지에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외로움과 고통을 나눠가진 우애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낸다.
또 순창군 풍산면 반월리 설씨 형제의 우애 이야기도 하늘이 감동한 형제의 우애로 알려져 있다.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권리에 전해 내려오는 우애좋은 형제 이야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에 전해지는 면지관 우애 이야기 등도 우애설화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고전에 나타난 우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형제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는 이야기의 결말도 결국은 우애를 지키는 쪽으로 모아진다. 재벌가 형제의 난이 수시로 지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다툼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는 요즘 세태와는 사뭇 다르다. 콩 한 쪽도 나눠먹는다는데 수천억, 수조원의 재산도 양에 차지 않아 진흙탕 싸움이라니 앞으로는 형제지간도 우애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