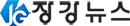날마다 되풀이 되는 일출은 우리네 삶의 경계이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하루 일을 마감한다. 그런 일이 일출을 경계로 평생 되풀이 된다.
일출과 함께 정유년 새날이 시작되었다. 새날이 되고 새달이 모여 새해가 열린다.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태양앞에 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일년이나 한달이나 하루 한 시간은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과 자전주기에 근거하고 있다. 새해에 뜨는 해는 장강 애독자의 큰 뜻이요. 새해에 부는 바람은 독자의 힘찬 기운이요. 온 세상에 뜻을 비추고 쉼없는 기운으로 내달릴 올 한 해 애독자의 해가 되십시오.
닭띠생은 역학적으로 감성이 풍부하고 순진하면서도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의를 중요시하므로 남을 존중하며 남들 앞에 은근히 자신을 부각시켜 나타내려는 기질도 있다. 낙천적인 편이라서 사람들 사이에 쉽게 융화하고 다정다감한 면을 보인다.
성격이 불과 같아 한번 성질이 나면 굉장하나 화가 풀리면 바로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다. 인내력이 부족하며 풍류가적 기질이 있어 놀기도 좋아하고 남과 사귀기를 즐기며 대인관계도 원만하다. 조용하고 온순하며 섬세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심하면 결벽증이 되기도 한다. 이성에 관심이 많으나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이며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 많다. 분위기에 약하고 또 귀가 여려서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니 주관을 가지고 분명히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기대와 설렘 희망보다는 무거움과 착잡함 그리고 걱정이 더하다. 시절이 오늘에 이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세밑을 이야기한다. 당연한 일이다. 한 해가 그 끝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누구나 회한(悔恨)을 가슴에 담는다. 지는 해를 바라보는 내 삶의 뒷녘에 사라지지 않는 긴 가닥처럼 아쉬움이 그림자를 드리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거듭 흐르지도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흘러온 삶을 또는 내가 살아온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밖에 없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데 어쩌면 영원한 기록일 터인데 회한의 순수나 그 지극함으로도 이미 산 세월을 되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세밑은 온통 잿빛이다. 이미 살아버린 세월 하기야 회한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면 문제는 간단하다. 좋았던 일, 새삼 긍지가 솟는 일들이 되돌아보면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탕삼아 새로운 세월을 맞으면 된다. 사실 그렇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살아온 삶의 흠을 드러내는 일은 지혜롭지 않다고 여긴다. 그래서 잘한 일, 자랑스러웠던 일을 찾아 그것을 한껏 크고 화려하게 꾸민다. 그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를 정당화한다. 자기합리화를 위해 산뜻한 논리를 구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낯선 의미들로 자기를 치장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스스로 지나온 세월을 감사하고 감격하기조차 한다. 마땅히 세밑은 이러해야 한다. 우울한 그림자로 이 시절을 채색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적극적으로 사는 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 편이 회한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보다 훨씬 생산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적극성이니 긍정성으로 보상할 수 없는 기만을 담을 수 있다. 자기도 남도 속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기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서은 남은 속인 것이든 자기를 속이든 자기파멸에 이름이다. 그러니 회한이 아무리 거추장스럽다 할지라도 세밑을 이렇게만 보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세밑에 이르러 밀물처럼 밀려드는 회한을 떨쳐버리는 길, 그것을 넘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듯 하다. 이에 세월을 끊어버리는 일이 그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말이다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해 새날을 맞는 일, 좋았던 일도, 한심스럽던 일도 지난 세월에 담아 다 흘려보내고 새날 새 아침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렇게 새 시간과 새 누리로 새 해를 맞는 일, 새해가 그렇게 되도록 세밑의 회한을 넘어서는 일만이 이 시절을 사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지난 좋았던 일, 이미 지난 부끄럽고 한스럽던 일들로 새해가 펼치는 새 가능성을 미리 얼룩지게 하는 것은 새해를 맞는 예의가 아닐 듯하다.
회한과 감격도 흘려보내야 한다.? 물론 이런 생각은 다만 꿈이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우리가 역사를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시간이란 단절되지도 않다. 그러나 새해는 이미 단절을 전제한 처음이다. 그러므로 새해는 그것이 이어진 시간의 마디라 할지라도 새 창조를 위한 분명한 계기이다. 따라서 새해는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단절을 획(劃)하고 비롯하는 처음이다.
그렇다면 세월을 끊어 되시작한다는 것은 꿈이 아니다. 오히려 세밑을 지내며 새해를 맞는 시절이 갖는 뚜렷한 현실이다. 가장 순수한 회한과 감격마저 낡은 해에 실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세밑의 윤리인 것이다. 세밑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 새해를 이렇게 맞고 싶다. 새해는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丁酉)년 처음 새해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