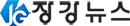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으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 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명절로 풍요의 대명사이다.
추석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다. 또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가위나 한가위는 수수한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의 한자로 쓰는 말이다.
본디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기서 길쌈이란 실을 짜는 일을 말한다.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의 한 달 전인 음력 7월 16일부터 나라 안의 여인들이 궁궐에 모여 두 편으로 나눠 공주들이 한편씩 거느리고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베를 짜서 한 달 뒤인 한가위 날 그동안 베를 짠 양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견주어 진 쪽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은 것에서 ‘가배’라는 말이 나왔다.
아름다울 가 ‘嘉’자에 풀무 배 ‘俳’자를 쓴다. 가배라는 말이 훗날 가위라는 말로 변했다.
농경사회에서 추석은 새 곡식과 햇과일이 나오는 풍성한 가을을 상징한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5월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등거리가 말을 날이 없지만 8월은 한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때여서 봄철 농사일보다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해도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니 그만큼 추석은 좋은날이다.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특히 농촌에서 가장 큰 명절이니 이때는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진다.
추석이 되면 새로 마련한 옷을 입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마음껏 놀았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성묘를 하는 아름다운 풍속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됐다.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고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이르러 추석의 의미는 다소 변질되고 퇴색되고 있지만 세시명절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중추가절을 맞아 더도 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은 국민의 행복을 추석만월에 기원해본다.
그럼 추석명절날 차례는 약식제사이므로 정규제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정식제사는 0시가 지난 밤중에 지내고 축문을 읽으며 술잔을 3번 올리지만(삼헌<三獻>) 차례는 이른 아침에 지내고 축문은 없다. 술잔도 한번만 올리고 촛불도 켜지 않는다.
차례는 제구(祭具) 설치나 제수(祭需)준비는 기제사와 시제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례는 기제사와 대상이 많은 조상들에게 모두 지내야 하기 때문에 종류는 같아도 숫자는 다르다.
고조비(고조?), 증조비(曾祖?), 조고비(祖姑?), 고비(考?) 4代 봉사를 하는 경우는 신위를 모시는 교의 제수를 차릴 제상, 제수를 담을 각종 그릇은 모두 4벌이 있어야 하고 기타 병풍, 향안, 향합, 소탁, 자리 등을 1벌만 있으면 된다.
그 배열은 높은 조상을 서쪽에 모시고 차례대로 동쪽으로 내려가도록 한다. 그러나 교의와 제상을 각각 준비하기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여러번 지내면 된다. 근래에는 제상하나에 밥, 국, 술잔만 조상 수대로 놓고 기타 제수는 한꺼번에 차리기도 한다. 차례의 상차림은 대체로 기제사와 같으나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적은 고기와 생선 및 닭은 따로 담지 않고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린다. 차례에서는 잔드리기 (헌작<獻爵>)를 한번만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밥과 국의 위치에 설에는 떡국을 놓고 한식과 추석에는 비워둔다고 하였으나 요즘에는 햇곡밥(올벼밥)과 국을 올린다. 추석에는 주로 토란국을 올린다. 한식에는 화전이나 쑥떡,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차례는 일종의 계절제사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나온 새 음식이나 새 과일들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진설순서(5줄) 1)지방, 초, 잔, 반, 갱 2)건, 육적, 소적, 채전, 어적 3)육탕, 소탕, 어탕 4)포, 콩나물, 나물, 숙채, 청장, 침채, 식혜 5)조, 율, 시, 이, 사과, 산자, 당과, 약과.
돗자리, 제주, 퇴주그릇, 향로, 향합, 축판, 모사그릇
▶좌포우혜-좌편에 문어, 명태, 오징어 오른편에 김치, 동치미, 숙채(불에 삶거나 쩌서 익힌 나물) 청장(간장)
▶어동육서-물고기탕은 동쪽, 육탕은 서쪽. 단탕, 삼탕, 오탕은 음수 홀수로 쓴다.
▶두동미서-어류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한다. (동쪽은 진설자의 우측 서쪽은 좌측을 뜻한다.)
추석-가배(嘉俳),중추절(仲秋節)
저작권자 © 장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