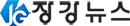1
후덥지근한 장마가 끝났다. 매미가 하품을 하듯이 노래하는 한가한 오후였다. 삼복의 뜨거운 햇볕은 아궁이에서 장작불이 타고 있는 가마솥처럼 푹푹 삶아댔다.
한여름에는 변함없이 뜨거운 햇빛이 쏟아져 내려왔다. 대지는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변해버렸다. 바다 같은 파란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거렸다.
불덩이 같은 빛줄기를 뱉어댔다. 화가 났는지 열기를 토해내며 심술을 부렸다. 바람 한 점 없었다. 제비들은 힘차게 날아다니며 조잘거렸다. 더위를 반기며 즐거워했다. 어느새 매미의 노랫소리는 불에 달궈져 축 처진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삼 복 더위가 사람 잡네.”
행동댁은 뒤란의 텃밭에서 김을 매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몸을 감싸고 괴롭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살갗에 찰싹 달라붙었다. 물에 빠진 생쥐 꼴이었다.
‘목이 타네.’
행동댁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적삼 깃으로 훔쳤다. 목이 말랐다. 호미를 놓고 벌떡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바가지를 들고 물동이에서 물을 퍼 벌컥벌컥 마셨다.
“어이구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네.”
행동댁은 찬물이 더위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상량머리에 부는 초가을 바람을 생각하며 상쾌함을 만끽했다. 자신도 모르게 빙긋이 웃었다.
짜증을 내면 더욱 덥고 괴로워졌다. 스스로 힘들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감정을 억제하며 억지로 달래주고 위로해야 되었다.
고통이 오면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했다. 자연의 섭리를 거역하면 자신만 괴로웠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불행이었다.
“아악, 아-악, 퇴!”
금순은 헛간에서 토악질을 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행동댁은 부엌에서 나갔다. 며느리가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새아가 어디 아프냐?”
행동댁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다가갔다.
“아니요.”
금순은 고개를 저어댔다.
“무얼 잘못 먹어서 체한 것 아니고?”
“괜찮은데 구역질이….”
“그렇다면 혹시…?”
행동댁은 며느리가 임심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척 하면 삼천리였다.
“속이 매스꺼워서…?”
“다른 데는 이상은 없고?”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토악질이….”
“언제부터 그러던?”
“여러 달 되었는데….”
“그렇다면 분명한데….”
“무어가요?”
“아니다. 더 두고 보아야….”
행동 댁은 돌아섰다. 틀림없이 애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잔약한데 임신까지 했으니….’
행동 댁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손자를 보게 되었다는 기쁨은 순간으로 달아나버렸다.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손자를 낳아주기를 기대하며 시름을 날려버렸다.
‘애를 낳아 길을 수 있을까?’
행동 댁은 며느리를 다시 살펴보았다.
“매애-”
매미는 감나무 가지에 앉아 시원하게 노래했다.
“몸가짐 잘하고 음식 조심해라.”
행동 댁의 귀에는 매미의 노랫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제가 임신을….”
금순은 깜짝 놀랐다. 부끄러워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니까!”
행동 댁은 돌아서서 뒤란으로 갔다. 텃밭으로 들어가 호미를 움켜쥐었다.
“나도 손자를 보게 되었네!”
행동 댁은 콧노래를 부르며 김을 맸다. 옥수수 줄기는 어느새 칠칠하게 자라서 껑충 솟아올랐다. 가다란 옥수수가 붙어 수염을 내밀고 있었다. 텃밭 가로 심어놓은 강낭콩은 꽃이 지고 열매가 맺혀있었다.
2
식구들은 꽁보리밥 몇 숟갈로 저녁을 때웠다.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앉아 삶은 감자를 먹으며 못다 채운 배를 달래었다. 모깃불은 연기를 흩뿌리며 시름시름 타고 있었다.
부채로 더위와 모기를 쫓았다.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았다. 하고 싶은 말을 찾아 만들었다. 재미는 없어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다.
정담을 나누며 가족들의 우정을 쌓아갔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건너고 있었다. 북극성이 있는 곳에서는 유성이 긴 꼬리를 내고 떨어졌다. 대보름날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샛별은 머리위에서 반짝거렸다.
“헛구역질 하는 것이 이상하다.”
행동 댁이 남편이 자리를 뜨자 운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요?”
운현은 어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누구긴 누구야. 새아기지.”
“무얼 잘못 먹었나요?”
“체해서가 아니라….”
“소화불량이 아니면…?”
“애를 갖은 것 같다.”
“그 몸에 임신을 해요?”
운현은 깜짝 놀랐다.
“나는 봄부터 토악질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진월 댁은 듣고 끼어들었다.
“봄부터요?”
행동 댁은 시어머니인 진월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알았으면 자신에게 귀띔을 해주지 않았다는 불만의 표시였다.
“시어미인 너는 눈치도 못 챘느냐?”
진월 댁은 퉁명스럽게 쏘아 붙었다.
“전혀요.”
“찬찬히 살펴보아라. 배가 불러오고 있어.”
“그렇다면 애를 갖은 게 틀림없네요.”
행동 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실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지요?”
운현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해졌다.
“다 하늘의 뜻이지.”
행동 댁은 별들이 반짝거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북두칠성을 찾았다.
“잘해주어라. 몸이 약한데 애까지 가졌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야.”
진월 댁은 손자에게 당부했다. 속내는 달랐다. 며느리가 들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집살이를 시키지 말라는 의도였다.
“먹고 싶다니, 무엇을요?”
운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신기하기만 했다.
“구해다 먹이려고? 사람마다 다르단다.”
행동 댁은 아들에게 눈짓을 하며 꾸짖었다.
“물어봐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해다 주어라.”
진월 댁은 손자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증손자를 보게 되니 한량없어 좋았다.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으면서.”
행동 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흘겼다. 꾹 참아왔던 지난날의 야속했던 일들을 뱉어냈다. 조심하느라 내색도 못하고 끙끙 알았었다.
“언제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을 해봤니?”
“물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행동 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기가 몸에 붙어 괴롭혔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토방에 올라섰다.
“그래서 서운했구나?”
“나도 사람인데….”
행동 댁은 힐끗 돌아보았다.
“미안하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진월 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운현은 믿어지지 않아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멍석을 말아 헛간에 가져다 두었다. 모깃불을 발로 밟았다.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내가 아버지가 되는가?’
운현은 산마루 위에 얹혀있는 둥근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얼굴이 화끈거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병든 아내가 애를 낳아도 괜찮을까?’
운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잔약한 아내가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애 낳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운현은 며칠 전에 건너 마을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아내는 괜찮겠지?’
운현은 하늘을 쳐다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