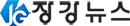6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운현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두워 소삽한 동네 앞 골목을 터벅터벅 걸어왔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간신히 바로잡아 세웠다.
“누구세요?”
운현은 앞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 장승처럼 서버렸다. 깜깜한 어둠 속에 소복을 한 뜬것이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운현이구나?”
행동 댁은 아들의 인기척을 알아듣고 반겼다. 어지러웠던 마음이 스르르 가라앉는 것 같았다. 손바닥으로 눈가를 쓱쓱 문질러 눈물을 닦았다.
“어두운데 무슨 일로…?”
운현은 어둠사이로 어머니의 모습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이상한 환상을 본 것 같아 불안했다.
“너를 기다리느라….”
행동 댁은 서러움을 삼키며 어눌하게 말했다.
“항상 늦게 오는 줄 알면서…?”
운현은 바투 하며 눈치를 살폈다.
“순조가 아파서….”
“동생이 까지 아파요?”
“낮에 몸에 열이 펄펄 끓더라. 업고 금정 면소재지에 있는 한약방에 갔더니….”
행동 댁은 가슴이 떨려 얼버무렸다.
“무어라고 하던 가요?”
“약방에서 소아마비 같다고….”
“소아마비요?”
운현은 깜짝 놀랐다.
“네 아버지는 조금은 회복 되어 기력을 찾는 가 했는데….”
행동 댁은 한숨을 쉬었다. 큰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 어리지만 집안의 장손인 큰아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편은 어려운데 집안에 우환이….”
운현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병환이 우선한 것 같으니 어린 동생이 소아마비라고 했다.
“가족이 끼니 때우기도 어려워 굶어 죽게 생겼는데….”
행동 댁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과 집안의 장손인 큰아들 뿐이었다.
“최선을 다해야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운현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들도 서러워 눈물을 흩뿌리고 있었다.
“너는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고….”
행동 댁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큰아들을 빨리 장가보내어 집안을 맡기고 싶었다.
“결혼요? 나에게 시집올 처녀가….”
운현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보았다. 벌써 열다섯 살이 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이미 장가들어 살림을 차리기도 했다.
“어서 들어가자. 저녁밥은 먹었냐?”
“과수원집에서 먹고 왔어요.”
운현은 사립문을 들어가며 어둠으로 가득한 집안을 둘러보았다.
“소쩍, 소쩍, 소쩍….”
마을 뒤 둔덕의 소나무에서는 두견새가 서러워서 눈물을 흩뿌렸다. 초여름인데 서러워할 일들이 아직도 많은지 홀로 남아 구슬프게 울어댔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원한과 슬픔을 혼자서 간직한 것처럼 구슬프게 흐느꼈다.
7
아침이 되니 태양은 어제처럼 동산의 능선 위에 얹혀있었다. 빛줄기는 세차게 뻗어 내려왔다. 인간의 삶과는 무관하게 밤과 낮이 바뀌며 반복되었다.
“아버지, 소를 팔아 동생 병을 고칩시다.”
운현은 과수원에 가서 품팔이해야 되었다. 집을 나서려고 토방을 내려갔다. 마당에 서서 툇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소를 팔아서 순조 병을 고치자고?”
명진은 햇빛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다. 날카로운 빛줄기가 눈동자를 찔러대어 괴롭혔다.
“소는 팔면 안 된다.”
행동 댁이 부엌에서 나오면서 단오하게 말했다. 소가 있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쟁기질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의 논밭도 갈아주고 품삯을 받아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명징의 생각은 달랐다. 자식이 먼저였다. 자신이 아플 때에는 생각지도 않았었다.
“소를 팔아 송아지를 사고 남은 돈으로 순조 치료비로 사용하면….”
운현은 지난 밤 동생의 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새우며 생각해낸 결론이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동생 순조의 병은 고쳐주고 싶었다.
“소를 팔고 송아지를 사자고?”
행동 댁의 귀가 솔깃해졌다. 좋은 방법 같았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은 살려야지. 병신이 되어도 안 되고.”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으니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고 어서 일하러 가자.”
행동 댁은 서둘렀다. 오늘은 밭매기 품앗이를 할 곳이 있었다. 품을 팔려면 새벽 같이 가야 하는데 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내가 꼴을 베어다가 쇠죽을 쑤어 줄 테니까 어서 가거라.”
명진은 외양간으로 갔다. 몸이 우선하니 빈둥거리며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소와 정들었는데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찡했다. 가족처럼 정성을 들여 길렀었다. 쟁기질 할 때에는 한 몸이 되어 논밭을 갈았었다. 자신의 분신이며 한 가족이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운현은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어깨가 처지고 침울해하는 표정을 보니 괴로웠다. 겉으로는 건강한 체 하지만 수척해진 몸은 병자 그대로였다.
“열심히 살아보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지.”
명진은 마당에 바지랑대처럼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답니다. 다녀올게요.”
행동 댁은 호미를 손에 들고 부리나케 사립문을 나섰다.
“비가 오려나?”
명진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낮게 드리워진 시커먼 구름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담담한 가슴을 시원하게 씻어줄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좋을 것 같았다. 빨랫줄에 앉아 있던 제비가 날아갔다.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에서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짹짹거렸다. 어미나 찾아와 먹이를 주었다. 새끼가 싼 똥을 물고 들녘으로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