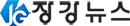오씨와 이씨는 앞 뒷집에 사는 데다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네 집 내 집이 따로 없이 형제처럼 함께 뒹굴며 자랐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지만, 오씨 마누라는 가을 부 뽑듯이 아들을 쑥쑥 뽑아내는데 뒷집 이씨네는 아들이고 딸이고 감감소식이다.
의원을 찾아 온갖 약을 지어 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설이 다가와 두 사람은 대목장을 보러 갔다. 오씨가 아이들 신발도 사고 아이들이 뚫어 놓은 문에 새로 바를 창호지 사는 걸 이씨는 부럽게 바라보았다.
대목장을 다 본 두 사람은 대폿집에 들러 거하게 뚝배기 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앞집 오씨네 아들 셋은 동구밖까지 나와 아버지 보따리를 나눠 들고 집으로 들어가 떠들썩하게 자기 신발을 신어 보고 야단법석인데 뒷집 이씨네는 적막강산이다.
제수를 부엌에 던진 이씨는 창호를 손으로 뜯으며 “이놈의 문은 3년이고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안 나니”라고 소리치다 발을 뻗치고 울었다. 이씨 마누라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흠씬 적셨다.
설날은 여자들이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날이다. 그믐날 밤에도 한두 시간 눈을 붙일까 말까 한 데 다, 설날은 꼭두새벽부터 차례상 차린다. 세배꾼들 상 차린다.
친척들 술상 차린다. 정신이 없다. 설날 저녁 주막에서는 동네 남정네들의 윷판이 벌어졌다. 이씨는 오씨를 뒷방으로 끌고 가 호젓이 단둘이서 술상을 마주했다.
이씨가 오씨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애원했다. “ 내 청을 뿌리치지 말게” “무슨 말인가?” “자네를 위한 일이라면 살인, 빼고는 무엇이든 하겠네” 이씨가 오씨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자 오씨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돼” 울상이 돼 말했다. “이 사람아,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 아닐세 천지신명과 자네와 나 이렇게 셋만이 아는 일,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씨는 통사정을 하고 오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연거푸 동동주 석 잔을 들이켰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피곤에 절어 이씨 마누라는 안방에서 곯아떨어졌다. 안방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와 옷을 벗고 이씨 마누라를 껴안은 사람은 이씨가 아니고 오씨였다. 확 풍기는 술 냄새에 고개를 돌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 간에 이씨 마누라는 고쟁이도 안 벗은 채 일을 평상시처럼 치르고 말았다. 이씨 마누라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진 걸 보고 오씨는 슬며시 안방에서 빠져나오고 이씨가 들어갔다.
모심을 무렵 이씨 마누라는 입덧을 하더니 추수가 끝나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씨 마누라는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다. 요 녀석이 자라면서 신언서판(身言書判)이 뛰어났다. 오씨는 틈만 나면 덤 너머로 이씨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오씨가 어느 날 훈장을 대신해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동들 사이에 열 살, 열두 살, 열다섯 살인 오씨 아들 셋도 끼어 있었다.
어느 날 이씨와 오씨가 장에 가는데 길에서 만난 훈장이 이씨를 보고 “아들이 천재요, 내년에 초시를 보도록 합시다” 오씨는 속이 뒤집혔다. 며칠 후 오씨가 이씨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벌컥벌컥 술을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 내 아들 돌려주게” 단호하게 쓴 한마디가 비수처럼 이씨의 가슴에 꽂혔다.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은 멱살잡이를 하닥 술잔을 놓고 밤새도록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내 사토 앞까지 가는 송사가 됐다.
오씨는 천륜을 앞세우고 이씨는 약조를 앞세우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또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다. 사또가 이씨 아들을 데려오게 했다. 자초지종을 다 애기하고 나서 사또가 물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일곱 살 그 녀석은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다. “지난, 봄에 모심기할 때 모가 모자라 우리집 남는 모를 얻어가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우리집에서는 앞집에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재판 끝, 쾅, 오씨는 듣거라.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헛소리를 할 땐 곤장을 각오해라.”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며 이씨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다. 정말 기가 막힌 명, 판결이네요. 씨앗만 제공했다고 내 곡식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