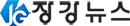소크라테스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하는 사회성이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도록 설계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거기에 부모들도 설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경쟁에서 이기는 설계를 강화하면서 효에 대한 부문을 소홀히 한 것이다.
후천적인 설계변경에 적응한 우리 아이들은 점차 본성적인 효의 감각을 잃고 초현실주의적 개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
아랫사람이 위 사람을 공경하는 것에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라는 일컬어 왔는데 이제 그 효 사상에 금이 가고 있다.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효는 저 멀리 내던져진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에는 효가 자리하고 있다. 효란 부모를 향한 배려와 염려의 마음으로 섬기는 행동이다.
제사를 마친 아버지는 나에게도 술잔을 건네셨다. 나는 아직 예닐곱 살 꼬마에 불과했지만, 선뜻 잔을 받았다.
이 술은 할아버지 주는 술이라 마시면 복을 받는다는 말에 저절로 이끌었던 것일까. 아니면 의관을 정제하신 아버지 모습이나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함부로 거역할 수 없게 했던것일까. 작고 붉은 목기에 담긴 그것은 겨우 혀끝을 적실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
그러나 닿자마자 목구멍을 넘어 저 깊은 안창까지 삽시간에 퍼져낙 온몸을 달뜨게 하였다. “아이구야, 제법이네!” 칭찬인지 놀림인지 분간은 안 갔지만, 모두가 웃는 소리에 나 또한 배시시 웃음을 머금었다.
제수를 진설하고 지방을 모시고 술잔을 올리는 아버지의 표정은 엄숙하고 경건했다. 한복 두루마기 정갈하게 차려입고 정성껏 절을 올리는 모습은 격조했고 공손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재자처럼 보였다. 오빠들도 당숙도 모두 아버지의 명에 따라 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처럼 숙연하고 진지했다.
나는 그 의식이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눈을 비비면서도 자꾸 상위를 흘끔거렸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느긋하기만 하셨다. 누구 한 사람 재촉하는 이도 없었다.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서걱거리기를 잊지 않던 뒤꼍의 대숲 까만 밤 오직 아버지의 열토 만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환하게 밝았다.
나는 설핏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그러나 아주 깊이 든 것은 아니어서 흔들자마자 곧장 일어났다. 하긴 깊이 잠들어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면서도 군침을 흘렸을 것은 뻔한 일, 나는 낮부터 맡았던 향기로운 냄새에 이미 코가 꿰어 있었다. 가난한 우리 집에 그렇게 은은한 향기가 도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나는 혼몽한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났다.
둘러앉은 상에는 갖은 음식들이 놓여있었다. 노릇노릇 도톰한 부꾸미와 정교한 꽃송이 같기도 하고 승천하는 용의 머리 같기도 한 수루메 한 마리 그리고 착착착착 아버지가 쳐놓은 신 희고 수북한 일반 접시, 나는 비로소 암암하던 그 음식들을 마음 놓고 입에 넣을 수 있었다.
짭짭 음식 먹는 소리와 도란거리는 이야기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뒤섞인 한밤중의 향연은 기분 좋은 포만감을 안겨주었다.
아버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서 “자, 막내도 한 잔!” 내게도 기꺼이 술잔을 내미셨다.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에 의한 내 최초의 술이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주막이 있었다.
나는 더러 노란 주전자를 들고 술 심부름을 했다. 술은 굴속에 있었다. 어둑하고 서늘한 굴속, 주인은 검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한 뒷박씩 주전자에 퍼담았다. 하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뽀얗기도 하고 누르스름하기도 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빛깔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음과 양,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이 한데 섞인 저희붐한 미명의 세계일지도 몰랐다.
그 맛은 시큼하기도 하고 텁텁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며 온갖 한의 소리를 불러오는 것일지도 몰랐다. 돌아오는 길 찰랑거리는 주전자에 입을 대고 살짝 맛을 보았다. 역시나 말로는 어려운 체험이었다.
들길엔 햇살이 너울거리고 나는 좀 비틀거렸던가, 어쨌던가 했던 것 같다. 아버지는 팔다리를 걷어붙인 채 논에 거름을 내고 계셨다.
화들짝 반기는 모습이 마침 출출한 참이셨나 보인다. 바위 끝에 걸터앉은 아버지는 술을 따라 고수레를 하고서야 당신도 드셨다.
안주야 풋고추 몇 개와 된장 깍두기뿐인데 쩔쩔 달게도 잡수셨다. 나는 고수레 술에 모여든 벌레들을 구경하거나 공연히 돌팔매를 해보 곤했다.
술 숲에선 푸르렁 꿩이 날아오르고 낮게 숨어 있던 고요가 놀란 듯 깨어났다. 나는 가벼워진 주전자와 함께 나풀나풀 집으로 돌아왔다.
가끔 아버지를 생각한다. 들판에 푸른 것들 남실대는 이맘때거나 어디서 산 꿩이 울거나 가뭇없이 해지는 저녁임ㄴ 문득 아버지가 그립다.
그럴 때면 쩝쩝 아버지 흉내를 내보고 싶다. 아버지가 하신 대로 당신에게도 술을 권하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