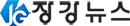장편소설 대가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벅(1892~1973) 여사가 1960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가 경주 방문 시 목격한 광경이다.

해 질 무렵 지게에 볏단을 진 채 소달구지에도 볏단을 싣고 가던 농부를 보았다. 펄벅은 지게 짐을 소달구지에 실어 버리면 힘들지 않고 소달구지에 타고 가면 더욱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농부에게 물었다. “왜,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힘들게 갑니까?”
농부가 말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저도 하루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서 지고 가야지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펄벅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기록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짜릿한 마음의 전율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늦가을 감이 달려있는 감나무를 보고는 “따기 힘들어 그냥 남긴 건가요?”라고 물었다. 겨울 새들을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라는 설명에 펄벅여사는 감동했다.
“내가 한국에서 가본 어느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이 감동의 현장을 목격한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자신한다고 기록했다.
감이나 대추를 따면서도 까치밥을 남겨두는 마음, 기르는 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작은 배려를 몸으로 실천하던 곳이 우리나라였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사람은 한 뿌리임을 알았다. 그래서 봄철 씨앗을 뿌릴 때도 셋을 뿌렸다.
하나는 하늘(새)에게, 하나는 땅(벌레)에게, 나머지 하나는 나에게 서로 나눠 먹는다는 뜻이다. 소가 힘들어할까 봐 짐을 덜어주려는 배려에 펄벅 여사는 감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