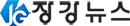가을이 깊어간다. 햇빛과 바람의 직조로 자연의 색깔은 소리 없이 변신을 한다.
사철 푸른 줄만 알았던 소나무도 가까이 서보니 가지의 아래쪽에서부터 노란색으로 물이 든다. 한지에 물감이 번지듯 녹색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곱디고운 색으로 스며든다.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니 나뭇잎들이 떨어져있다. 갈색으로 변해버린 잣나무와 소나무 잎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잎들이 간밤에 소리 없이 낙엽 되어 돌아왔다.
한 이파리의 나뭇잎이 떨어지므로 해서 천하가 가을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싸리비로 쓸어 마당의 한 귀퉁이에 모아 놓고 한참동안 바라본다.
흙과 낙엽을 켜켜이 쌓아 차가운 이슬과 아직 남아있을 법한 마른 잎의 온기로 썩어 기름진 흙이 되면 내년 봄밭에 뿌릴까. 아니면 성냥불 그어 불을 지피고 낙엽 타는 냄새를 맡으며 피어오르는 연기에 또 한 해의 이지러짐을 생각할까.
바람이 분다. 마른 낙엽은 작은 바람에도 뒤척인다. 세상 인연에 집착하기에는 너무나 가볍다. 작은 소망도 놓아버리고 떨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하다.
이슬의 몸무게도 버거운 듯 함초롬히 젖어 있다. 많은 날들을 비에 씻고 바람에 닦아서도 또 씻을 것이 남았나 보다.
작은 낙엽들 위에 거무스름한 진갈색의 커다란 잎이 두꺼비 형상으로 웅크리고 있다. 플라타너스 잎이나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없이 추위가 닥쳐와 어찌할 바 모르고 거리를 헤매는 군상의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 생의 끝자락이란 말인가. 플라타너스 낙엽 한 잎을 손에 들고 본다.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몸의 모든 기능을 눈으로 모아 초점을 맞추고 낙엽을 본다. 이른 봄 나무의 두꺼운 표피를 뚫고 힘차게 돋아나던 기백은 흔적도 없다.
뽐내고 자랑하던 멋도 찾을 수 없다. 일상의 바람도 이겨내지 못하고 찬 기운에 살갗이 군데 터졌다.
찬바람이 분다.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 아래 당당했던 풍채는 간곳이 없다.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던 용기와 인내도 놓아 버렸다. 번영을 간직하고 풍요를 노래했던 욕망도 사라졌다. 캄캄하고 단단한 땅속 돌 틈 사이의 물줄기로 피워낸 환희의 함성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가을은 왔다.
한잎 두잎 고운색으로 변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그루전체가 빨갛게 혹은 노랗게 물들었다. 무서리가 하얗게 내리고 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세상 사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낙엽처럼 욕심과 아집을 줄이고 버리는 색깔이고 느낌표가 아닌가. 한 생의 권세와 부귀영화 덧없음을 보여주는 빛바랜 자화상이다.
황홀했던 빛깔도 매혹스런 향기도 혈관을 흐르는 맑은 액체도 다 버렸다. 살갗 속에 감춰졌던 실핏줄 같은 그물맥이 모양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에도 버려야 할 것이 좀 많은가. 쓰레기를 버리듯 뱃속의 오물을 버리듯 버려야 한다. 가슴에 담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나 마음에 병이 되는 것은 버려야 한다. 그러나 버리기가 어렵다.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볍다. 체중을 줄이듯 욕심을 떨치고 나면 우리의 마음도 낙엽처럼 가벼워지는 것인가. 바람이 분다.
저항 없이 날린다. 그때마다 바스락 거리는 것은 가슴속을 다 비웠음을 알리는 몸짓이러니 그리고는 썩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나를 짓누르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아름다울 수도 없다. 가벼움의 행복도 알 수가 없다. 낙엽을 얼굴 가까이 대고 눈을 감는다. 마음으로 넉넉해지는 울림이 전해온다. 진실한 삶의 냄새가 향기로 스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