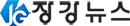끝은 언제나 아쉽고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희망을 꿈꾸게 한다. 그래서 오늘의 아쉬운 미완을 내일의 완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초석을 삼아 새해에 장강인 여러분들의 꿈을 잃지 말고 항상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뜨고 지는 해가 1월 1일 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지만 맺고 끊음은 사람들의 삶속에서 새로운 긴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한다. 올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안락이 깃들이기를 축원한다.
다른 해 보다 신정 휴가가 짧았다. 1월 2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새해를 열고 자 새로운 각오로 출발점에 섰다. 성취하려는 저마다의 소원은 새해마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가족의 건강과 성공을 비는 것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정치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도 다시 활발해지기를 기원하고 국민의 사회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빌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희망뿐 일 수 있다. 시종(始終) 끝과 시작은 사람이면 살아오면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끝맺음에 관한 것이다. 마무리를 잘 할 것과 뒤에 잘 정리할 것을 배웠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끝을 기다리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오신 나의 아버지는 그 끝의 맺음을 느슨하게 하지 않으셨다.
과일이나 푸성귀의 끝물도 빠짐없이 거두셨고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일로써 추수는 끝이 났다. 끝일을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비록 큰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것을 버려두지는 않으셨다. 매일의 일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쇠죽을 끓이고 군불을 땔 때에는 아궁이 앞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쓸고 정리하셨다. 겨울밤 추위에 외양간의 소가 떨지 않을까 염려해서 소의 등에 덕석을 덮어 주시는 일을 빠뜨리지 않으셨다. 겨우 내 눈이 쌓이고 쌓여도 잔설을 틈이 나는 대로 치우셨다. 어머니께서는 주무시기 전에 식구들이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돈하셨다.
하루를 보내거나 계절을 보내거나 농번기와 농한기를 보내거나, 한해를 보낼 때에 당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만큼은 힘껏 하셨다.
그 결과를 모자라거나를 상관하지 않고서 그냥 그 일을 할 뿐이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태어남과 죽음을 노래한 시 ‘탄생’을 썼다.
한 생애와 시작과 끝 사이에 펼쳐지는 삶의 과정을 보고 눈을 갖고/먹고 울고 넘쳐흐르고/사랑하고 사랑하며 괴롭고 괴로운 것으로/그전이 그 전격적인 현존의/진동이라고 표현했다. 네루다의 시구처럼 일의 경과에는 파동이었다.
때로는 우연의 계기가 개입해 극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의 큰 파도일 때도 있다. 물론 평온하고 기쁜 시간도 있다. 시간의 강은 여러굽이를 만들면서 흘러간다. 여럿의 굽이를 만나 전환하면서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역동적인 전환을 보여주면서 끝을 흐지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온 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벌이고 행한 일들의 진동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지금과 내일의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달에 해야 할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상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이해의 마지막 날까지 하는 것이다. 이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시간을 포기하는 시간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나는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로부터 하루 이틀하고 말 일이 아니다라는 애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한해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때에 매우 적절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난해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도와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까 한다. 나를 돌아 보는 일은 나의 허물을 보는 일이다. 허물을 보아서 허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비유의 문장 가운데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이라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법구경에 있다.
자신이 어떤 부정하고 그릇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누구나 구름속에서 나온 달처럼 세상을 다시 능히 비출 수 있다는 뜻이다. 자기를 바로 볼 때 본래면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도 잊지 않으려 한다.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시 ‘끝과 시작’을 썼다. 그는 하나의 시간과 역사가 끝나고 다른 하나의 시간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전쟁이 끝난 후 벌어지는 일들에 빗대어 표현했다. 전쟁이 끝난 후 피 묻은 넝마가 널린 길을 청소하고 잔해들을 치우고 다시 대들보를 옮기고 유리를 끼우고 문을 달고 다리를 놓고 역을 세우는 일들에 비유했다.
그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조금 밖에 모르는 혹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심보르스카는 이 세상이 원인과 결과가 ‘고루 덮인 풀밭 위’라고 썼다.
세상의 일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이다. 시간의 변화를 바라보는 좋은 안목이 아닐까 한다. 들에는 가을걷이가 끝나고 밭에는 그루터기만 남았다. 적막한 풍경을 바라보면 박목월 시인이 쓴 시 ‘내년의 뿌리’도 생각난다. 마지막 연을 이렇게 썼다.
『마른 대궁이는/금년의 화초』 땅속에는 내년의 뿌리 올해의 끝은 내년의 시작으로 연결된다. 밤의 시간에 낮은 이미 시작된다. 그러므로 끝은 곧 시작이다.